중광(重光)을 위하여
중광이 입적한 지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이다. 공교롭게도 20대 대선이 치러진 3.9일이 기일이었다. 윤 대통령 당선자가 대학시절 인연이 있었다고도 하는 중광이지만 아쉽게도 그를 기리는 전시나 행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일까. 미술계나 문단계가 따라올 자 없는 중광의 도발적인 천재성에 지금도 충격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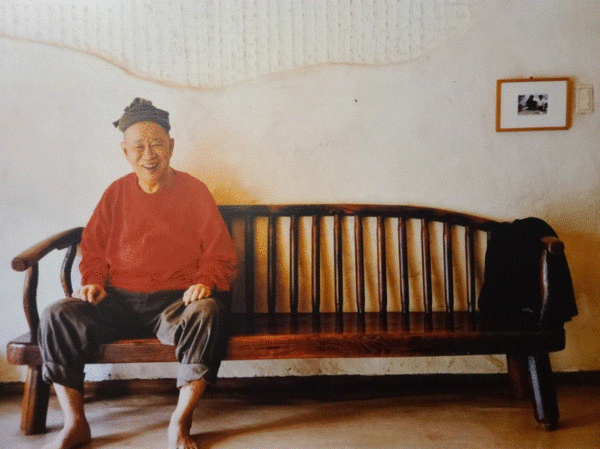
필자는 부끄럽게도 그동안 중광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먹물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어깨에 메고 미친 행세를 하며 세인의 이목을 끄는 것을 희열로 여기는 편집증의 치탈도첩 괴승이라고만 여겼다. 어쩌다 그의 그림을 보면 어린애도 그릴 것 같이 보이는 학이나, 형체도 제멋대로인 달마의 번뜩이는 눈동자 정도가 기억 날 뿐이었다. 적어도 배접된 한지에 제대로 그린 그림들을 보기 전까지는 그의 정신인 무애(無碍)를 무애(無愛)로, 고졸(古拙)을 고졸(高卒)로, 돌(咄)을 구출(口出)로 읽었다.
그러나 중광의 시와 글씨, 제대로 그린 그림 등을 접하고 나서는 형언하지 못할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필자와는 하늘같은 해병 선후배 사이나 비루한 학력 정도의 동질성만 있을 뿐이지만 계보도 없이 오직 단독수행으로 독보적인 선화(禪畵)의 경지를 일구었다는 경이로움이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온전히 선화이어야 하며 선화는 졸(拙)을 배우는 것이다. 베끼거나 찍어내는 그림들과는 시도부터 결이 다르다.
생전에 교류를 가진 장욱진 화백과는 열여덟 살, 김기창 화백과는 스물두 살, 구상 시인과는 열여섯 살, 천상병 시인과는 네 살 차이이다. 중광이 그만큼 어리다. 한용운 선사와도 깊이 교류하며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효당(曉堂) 최범술씨는 중광을 대안대사와 원효대사의 한자씩을 따서 안원방장(安元方丈)이란 호를 지어주고 그가 그린 달마도에 요사필(了事畢)이란 글씨를 써주었다. 아들 뻘도 안 되는 31년이나 어린 중광에게 자신이 소장하였던 한용운 선사의 한정판 영인본 한시집을 증정하면서 화남(和南)이라 적었다. 중이 합장하여 예배한다는 뜻이다. 월하스님은 중광을 깨달은 자를 이르는 삼하(三河)라고 불렀다. 27년 어른인 청남(菁南) 오제봉님도 중광의 달마도에 노서입각이라 쓰고 늙은 쥐가 끝이 점점 좁아지는 소뿔 속에 들어가 옴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최고로 극한상황을 딛고 체득한 경지의 그림이라 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중광이 그려준 예수님을 집무실에 걸어 놓았다.
장욱진 화백이 그린 중광의 초상화는 삼성출판사에서 발행한 중광도록의 첫 페이지에 화보로 실릴 정도였다. 중광도 장욱진 화백의 초상화를 그렸으나 본인에게는 전달되지 못했다.
미친 땡중이 어쩌다 객기로 그린 그림이던지 예술혼의 바탕이 천하였다면 규율과 자기수양에 철저한 고승들이나 선배 시인, 화가들이 어린 중광을 그렇게 극찬 하였을까. 기교를 부리고 명성이나 그림팔이에 욕심내는 중광이었다면 말이다.
선(禪)의 핵심은 생각으로 답을 더듬고 찾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고 박살내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으니 중광의 그림이 치졸하고 상스럽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중광의 그림은 사군자, 달마, 채색화와 유화, 도자, 어린이나 동물, 학, 달마 순으로 진화된다. 해맑은 어린이나 학 그림이 우연한 그림이 아니라 수십 년을 고행한 내공, 즉 무심선묵(無心禪墨)으로 달마를 그리는 자만이 그려낼 수 있는 최고의 선화인 셈이다.
위대한 예술가 옆에는 그를 지켜준 누가 있기 마련이다. 중광에게도 중광을 알아보고 곁을 지켜준 여인이 있었다. 홍익대 미대 서양화과를 거쳐 서울대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창창한 화가였다. 검정교과서에 그림이 실릴 정도의 재원이었다. 중광은 입버릇처럼 그녀를 만나고 부터 그림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시 “눈곱 낀 못난 아낙네에게 장가를 들어...”라는 대목이 나오는 재입산은 바로 사랑하는 그녀에게 바친 헌시였다. 참으로 고독해서 넘실넘실 춤을 추어야 했던 중광의 손과 발이 되어 작품의 혼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녀는 지금 안타깝게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다.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이 100여개가 되는 지붕 없는 박물관 제주도에 2025년 쯤 드디어 중광의 미술관이 생긴다고 한다. 그 뉴스가 나오자 제주의 어느 지방지 기자는 인지도도 낮고 연구도 부족한 인물의 미술관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기자 분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그린 중광의 그림을 보고 중광의 사상을 연구했는지 묻고 싶다.
예술이 없는 사회는 삭막하다. 중광 미술관은 문화예술이 근간이 될 마이스 산업의 한 축으로 그를 아끼는 수많은 애호가들이 찾게 될 것이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이다. 하이브리드 시대요 통합의 시대이다. 스스로를 걸레로 낮추었던 중광, 외국에서 먼저 알아보고 한 시대를 앞서간 시.서.화의 삼절(三絶) 중광은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소환해야 할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현 한국공무원문인협회 이사
현 인천 문협 이사
시집 '도두를 꿈꾸는 하루(문학의전당)' 외 6권

